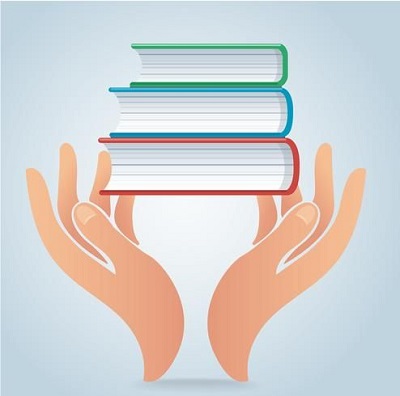[한국독서교육신문 백원근 독서출판평론가]
출판사에서 책을 쓴 저자에게 지불하는 ‘저작권 사용료’(royalty)를 인세(印稅)라고 한다. 보통은 출판계약을 맺을 때 제작 부수 또는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정가의 10% 수준에서 정한다. 책의 제작(인쇄) 부수나 판매 부수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과거에는 저자의 도장을 찍은 인지(印紙)를 책의 판권지(간기면)에 붙였고, 그 제작 부수 기준으로 인세를 지불했다. 저자와의 협의에 따라 인지 첨부가 생략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는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인세를 정산한다. 지금은 인지가 첨부된 책을 찾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책이 2천 부 팔렸을 경우 10% 인세를 적용한다면 출판사가 저자에게 200만 원을 지불하는 식이다. 계약 시에 계약금을 선불금으로 지불했다면 그것은 공제한다. 그런데 아주 소량의 책만 찍거나 제작비가 나오기도 어려운 출판의 경우는 인세가 전혀 없거나 인세 대신 책을 저자에게 일정 수량 기증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검증되지 않은 신인 저자의 인세율은 대체로 10% 이하이지만, 대량 판매가 확실한 인기 도서일 경우에는 출판사들 사이의 출판계약 경쟁이 붙거나 저자의 요구에 따라 20% 이상의 인세를 지불하기도 한다.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출판사 이익이 많아지므로 인세율도 연동해서 높아지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번역서의 경우라면 번역료나 중개수수료 등이 추가되므로 국내 저자보다 낮은 6~7%의 인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세율이 통상 10%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10% 인세’는 그간 출판계의 불문율과 같았다. 그런데 ‘도서출판11%’라는 출판사에서 11% 인세와 투명한 인세 정산 시스템을 내걸어 신선한 화제가 되고 있다. ‘도서출판11%’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지며 크게 화제가 된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2019)의 저자 임홍택 씨가 편집인이며, 그의 아내가 대표인 출판사이다.
신생 출판사에서 그 이름까지 11%로 표방하며 나선 데는 기존의 불투명한 출판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투명한 정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임홍택 씨는 『90년생이 온다』의 저자로서 출판사의 종이책 인세의 일부 누락과 전자책 인세 미지급으로 인해 소송까지 벌인 경험이 있다. 서점 위탁 판매 방식 때문에 출판사조차 시기별로 정확한 판매 부수를 알기 어렵고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체감했던 것이다.
그래서 ‘도서출판11%’는 발행(인쇄) 부수를 기준으로 2만 부까지는 11%의 인세율을, 5만 부 이상인 경우 15%의 인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제작 부수 구간별로 인센티브를 준다. 또한 저자가 소유하는 홀로그램 인지(스티커)를 책마다 붙여 판매 부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의 인쇄 고유 번호를 알 수 있는 스티커에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만든 보안잉크와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했다. 이에 대한 출판계의 관심도 높다고 한다.
‘도서출판11%’의 시도는 새롭다. 판매 부수 기준 인세를 제작 부수로 바꾸고, 신인 저자에게도 11% 인세를 공통으로 적용한다는 점, 과거 모든 책에 저자가 도장을 찍어 종이 인지를 부착했던 것을 업그레이드하여 홀로그램 방식으로 했다는 점이 그렇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인지를 생략하던 관행을 바꾸어 책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번거로움이 따르겠지만, 저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인세율 상향, 판매 부수 기준에서 제작 부수 기준으로의 인세 기준 변경 등 출판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는 특히나 출판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쉽게 확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에서 근무하며 재고관리의 기본을 익히고 베스트셀러 저자로서 투명한 인세 정산의 중요성을 경험한 임홍택 씨의 ‘출판계 바깥의 문제의식’이 만든 인세 시스템 혁신이 향후 출판계로 얼마나 확산될지 주목된다.
<백원근 독서출판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