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는 살인은 없고, 살인에 대한 기억만 있다. 그리고 살인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의 불확정성과 불가해성만 있다. 이럴 때에는 살인에 대한 단죄나 폭력에 대한 성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살인이 아닌 살인‘자’, 기억이 아닌 기억‘법’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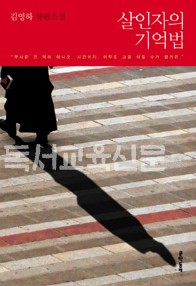
행위가 아닌 인간, 객관이 아닌 주관이 문제될 때는 살인조차도 주제가 아닌 배경으로 작용한다. 이를 위해 작가는 연쇄살인범을 치매에 걸리게 한다. 그리고 스스로 입양해 양녀로 삼은 마지막 살인 피해자의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범을 등장시켜 주인공과 대치시킨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전도된 상황을 통해 작가는 살인이 아닌 시간의 폭력성을 문제 삼는다. “무서운 건 악이 아니오 시간이지. 아무도 그걸 이길 수가 없거든.” 16살에 가족한테 폭력을 일삼는 친아버지를 죽인 이후, 자신도 아버지가 죽은 나이인 45세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 꾸준히 살인을 저지른 주인공은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후 살인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고, 그 이후에 “인생이 보내는 짓궂은 농담”처럼 치매에 걸린다. 그의 유일한 기억의 목적은 딸을 죽이려는 살인범으로부터 딸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딸은 딸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이고, 살인범은 살인범이 아니라 형사이다. 모든 것이 기억과 다르다. 다시, 이 소설은 살인에 대한 소설이 아니라 혼돈과 두려움, 몰이해에 대한 소설임을 기억하자.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열정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인생은 지나치게 부조리하다. 이런 거대한 악몽 속에서 주인공은 타인의 고통에서 자아의 고통으로, 육체보다 먼저 죽는 영혼의 고통으로 이동한다. 이런 이동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다. “인간은 시간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다.” 그렇지만 “기억을 모두 잃는다면 더는 인간이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망각한다. 혹은 망각한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그런 기억법을 통해 이 소설은 내가 기억하는 것이 과연 진짜 나인지, 나의 기억은 원래 나의 것인지를 질문하는 ‘살인자의 기억법’을 가르쳐 준다.
- 추천자 : 김미현(이화여대 국문과 교수)

